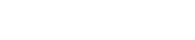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
살인, 그것은 분명히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범죄’다. 용서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악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를 죽이는 살인이라면 어떨까?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살인’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는 인간의 이면을 담아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탕’.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다. 특별한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다. 이때 시청자는 여러 감정을 떠올린다. 그가 곧 경찰에게 잡힐 것이라는 예측과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에 압박과 긴장, 불안을 느낀다. 작품의 외적 관찰자로서 주인공인 이탕이 붙잡히지 않아야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에 도출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범죄자가 잡히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니 말이다.
드라마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가 죽이는 사람은 전부 범죄자라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범죄자를 찾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보니 범죄자인 것이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증거물은 전부 감쪽같이 사라진다. 비가 내려서, 증거품을 도둑맞아서 등등 이유도 다양하다. 또한 그는 악을 처벌하는 ‘집행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의 조력자도 그를 ‘영웅’이라 떠받든다. 이른바 ‘악의 처단’은 그리 신선한 전개나 구조는 아니다. 다만 『살인자ㅇ난감』이 유독 독특한 것은, 이탕의 살인에 그 어떠한 감정도 담아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죽이고 싶으면 죽인다. 기존의 ‘사적 제재’에 대해 다루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정의감과 의협심에 불타오르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쯤 되면 시청자는 이렇게 느낀다. ‘이탕이 죽이는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말이다. 혹은 그가 죽이는 사람이 무슨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거나 이번엔 또 어떻게 죽일까 기대한다. 결국 시청자의 감정은 마치 ‘살인자’의 감정처럼 변한다. 살인의 정당화, 카타르시스, 흥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른다. ‘어차피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라는 감각이 ‘살인’을 오히려 흥미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청자 사이에서는 ‘저렇게 처벌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살인자ㅇ난감』은 웹툰이 원작이다. 당연히 드라마의 제목도 웹툰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다. 작가는 대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는 그 이유를 마지막 화에서 밝혔다. 제목은 ‘살인자 난감’으로 읽을 수도, ‘살인 장난감’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말이다. 다만, 작중 이탕의 살인에 감화됐다면 ‘살인 장난감’으로 읽힐 것이라 전했다. 마치 장난감 다루듯 손쉽게 사람을 죽이는 데 재미를 느꼈다면 말이다.
당신은 이 드라마의 제목을 뭐라고 읽었는가?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