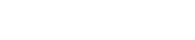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BBC 선정 버킷리스트 1위, 그랜드 캐니언” 수백만 년간 풍화와 침식으로 빚어진 그랜드 캐니언은 지구 역사의 ‘산증인’이다. 자연이 빚어낸 절벽과 형형색색의 암석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와 유타주에 걸친 ‘그랜드 서클’에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절경을 만날 수 있다. 그랜드 서클은 그랜드 캐니언을 중심으로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등 미 서부 국립공원들을 엮어 부르는 말이다. 머나먼 땅 미국에서 그랜드 서클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스케치해 봤다.
신의 정원, 자이언 캐니언
 |
| 전망대에서 보는 자이언 캐니언 풍경 |
무더운 라스베이거스의 여름 새벽 5시, 1박 2일간의 그랜드 서클 투어가 시작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너 시간 이동해 처음으로 마주한 곳은 바로 유타주 자이언 캐니언(Zion Canyon)이다. 이곳은 알록달록하고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로 수놓아져 있다. 과거 몰몬교도들은 그 풍경이 마치 천국과 같다며 성경에서 ‘성지의 언덕’을 의미하는 시온(Zion)을 지명으로 붙였다.
온전한 캐니언 감상을 위해 필요한 건 시간과 체력이다. 대자연 감상에 공짜는 없다. 대부분 국립공원은 등반 코스를 난이도와 거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있는 여행객들은 모든 코스를 감상하지만, 일정이 빡빡한 경우 특정 ‘뷰 포인트’만 거쳐 여행한다. 캐니언 6개를 가야 할 기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이라 비교적 짧은 코스를 택했다.
‘신의 정원’이란 별명이 붙여진 자이언 캐니언은 웅장함 그 자체다. 그 모습을 감상하다 보면 왜 이 같은 별명이 붙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날카롭게 솟은 바위산들은 야성적이고 우직한 매력을 뽐낸다. 크림색, 분홍색, 붉은색 등으로 이뤄진 모래 바위와 수풀 고원에 더해 이따금 마주치는 사막큰뿔양들은 자연의 신비를 보여준다. 이곳을 걷다 보면 수많은 거대 바위를 만나는데, 뜨거운 햇살에 지칠 때쯤 바위가 만든 그늘은 달콤한 휴식공간이다.
등반 끝에 전망대에 오르면,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It's amazing!” “Unbelievable”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세계 각지 여행객들의 탄성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는 그 웅장함을 대변한다.
후두의 향연, 브라이스 캐니언
 |
| 후두가 펼쳐진 브라이스 캐니언 |
이어서 유타주 남부의 브라이스 캐니언(Bryce Canyon)을 방문했다. 길쭉한 첨탑들이 줄지어 있어 섬세함이 빛나는 이곳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니언이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전 세계 가장 많은 후두(hoodoo)가 펼쳐진 곳이다. 바위기둥을 뜻하는 후두는 그 크기가 아파트 1층부터 10층 높이까지 다양하다. 우직하고 거대한 매력을 뽐냈던 자이언 캐니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약 30분간의 등반을 거쳐야 감상할 수 있다. 초반 길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내려가게 돼 있는데, 위에서 보면 마치 지하 10층 정도의 깊이감이 느껴진다. 길을 내려가면 두 개로 갈라진 큰 바위를 만난다. 실낱같은 햇빛만 드리우는 이곳을 걸으면 마치 동굴 같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첨탑으로의 여정에 지친 여행객들도 여럿 보게 된다. 연신 사진을 찍고 일행과 발을 맞추려 뛰어가던 기자에게 한 영국인은 “You have a good stamina”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올라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브라이스 캐니언의 풍경을 보니 피로감이 전부 씻겨 나갔다. 정상에 서면 진홍빛 기괴암을 만나는데, 길고 뾰족뾰족한 바위는 다양한 색상과 두께로 장관을 이룬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시간과 위치마다 다른 매력이 드러난다. 그림자가 드리우면 다소 밋밋해지지만, 햇빛이 한창인 시간에는 마치 바위들의 생명이 깨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환상적인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선 다양한 곳에서 바라봐야 한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여러 지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스퍼레이션 포인트(Inspiration Point)부터 ‘토르의 망치’ 모양 후두가 있는 나바호 루프(Navajo Loop)까지. 어느 곳에 서 있는가에 따라 브라이스 캐니언의 ‘맛’은 달라진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파웰 호수
 |
| 파웰 호수, 저 멀리 유람선이 지나간다 |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 두 캐니언 구경을 마치고 애리조나주로 이동했다. 두 시간에 달하는 이동 거리에 일행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기자는 풍경을 눈에 담고자 잠을 이겨냈다. 뻥 뚫린 일자 도로에서 좌우로 펼쳐진 사막과 암석을 감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캐니언 투어’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자 도로를 넘어 그려진 지평선은 아름답다.
이동 끝에 어느덧 파웰 호수(Lake Powell)에 도착했다. 이곳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인 콜로라도강에 위치한 ‘인공호수’다. 1936년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자연스레 수몰되는 지역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겨난 게 바로 파웰 호수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한 팔을 잃은 존 웨슬리 파웰(John Wesley Powell)은 전쟁이 끝나고 콜로라도강 탐험을 통해 일대의 지형을 명명하고 지도를 제작했다. 이러한 파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 호수를 그의 이름으로 지었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으로 만든 경관인 파웰 호수는 조용하고 잔잔한 매력이 흐른다. 먼발치에선 그랜드 캐니언도 엿보인다. 수년간 가뭄으로 물의 양이 확 줄어든 것은 아쉬웠지만, 호수에 떠다니는 수많은 유람선은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파웰 호수의 별미는 드 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찍는 ‘점프 샷’이다. 다른 캐니언과 달리 낭떠러지가 없어 많은 여행객이 안심하고 손과 발을 높이 들며 사진을 찍는다.
파웰 호수는 그랜드 서클을 여행하는 이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주변에 호텔, 캠핑장, 월마트 등이 있어 많은 이들이 하루를 묵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이 여행객들의 쉼터가 된 이유는 따로 있다. 파웰 호수 주변이 별구경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고 구름과 달빛이 없다면 빼곡히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감상할 수 있다.
환상적인 말발굽, 홀슈스밴드
 |
| 말발굽을 닮은 홀슈스 밴드 |
2일 차 첫 번째 일정은 애리조나주 페이지에 위치한 홀슈스밴드(Horseshoe Bend)로 시작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암벽 모양이 마치 ‘말발굽’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암벽을 따라 콜로라도강이 흐르고 있다.
홀슈스밴드로 가기 위해선 주차장에서부터 20분을 걸어야 한다. 이곳은 평지임에도 일조량이 상당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한 모자와 선글라스, 물은 필수다.
햇빛을 뚫고 도착한 홀슈스밴드는 넓은 사막 한 가운데에 있었다. 말발굽 모양의 거대 자연물과 그 곁을 흐르는 강은 한 폭의 그림이다. 청록빛 색을 담고 있는 콜로라도강이 협곡을 휘감아 돌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경관을 체험할 수 있다. 아래 호수에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트가 지나다닌다. 이 보트를 타면 글랜 캐니언 댐부터 홀스슈 밴드까지 직접 감상이 가능하다.
홀슈스밴드의 절벽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 때문에 이곳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선 특별한 주의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 발짝 더 다가가면 푸른 빛의 콜로라도강과 함께 홀슈스 밴드를 온전히 담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이곳에선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 피날레, 그랜드캐니언
 |
| 리판 포인트에서 바라본 그랜드 캐니언 |
그랜드 서클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Grand Canyon National Park)에 이르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뚫고 공원의 사우스림(South Rim)으로 이동했다. 공원은 노스림(North Rim)과 사우스림으로 나뉘는데, 노스림은 해발고도가 사우스림보다 400m가량 높다. 고도가 높은 노스림은 낮은 기온과 잦은 폭설로 11월부터 5월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반면 사우스림은 지형도 평탄하고 도로가 잘 돼 있다.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곳으로 향한다.
사우스 림의 뷰 포인트는 무려 10개에 달한다. 그랜드 캐니언이 446km로 매우 긴 까닭이다. 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비슷하다. 리판 포인트(Lipan Point)에서 바라본 그랜드 캐니언은 특히 아름답다. 리판 포인트는 캐니언의 전망을 넓게 ‘횡’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어, 진정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공간이다.
콜로라도강 물줄기가 저 멀리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유유히 흐르는 콜로라도강과 빨간 바위는 사뭇 대조되지만, 사진 속 한 장면처럼 어울린다. 이러한 위대한 자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륙 이동과 화산활동으로 콜로라도 고원이 만들어진 후, 콜로라도강이 약 600만 년에 걸쳐 지표면을 침식해 오늘날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이 됐다.
내려다보이는 콜로라도강과는 무려 1,500m가량 떨어져 있다. 등반을 해서 내려가는데 5시간, 올라오는데 9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곳의 날씨는 제법 선선한데, 아래 보이는 강바닥보다 평균 17도나 낮다.
리판 포인트에서 야바파이 포인트(Yavapai Point)로 가는 길에선 이따금씩 사슴들도 마주할 수 있다. 야바파이 포인트로 이동하자 비가 더욱 쏟아졌다. 비를 맞고 전망대에 가봤지만, 옅은 안개로 캐니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며
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일정은 엔텔롭 캐니언(Antelope Canyon)이었다.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활용된 이곳은 인디언들의 사유지로, 원주민 가이드를 통해서만 여행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에 위치한 까닭에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투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다.
결국 엔텔롭 캐니언을 감상하지 못한 채 캐니언 투어를 끝마쳤다.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그 빗물에 차의 창문마저 깨질 것만 같았다. 이동하다 보니 점차 먹구름이 걷히며 비가 조금씩 그쳤는데, 이때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다. 먹구름이 한두 곳에 몰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먹구름이 형성돼 비가 내리는 게 보이는 쪽과 달리 기자가 있는 쪽은 완전히 맑은 하늘이었다.
비로 인해 그랜드 캐니언과 엔텔롭 캐니언을 보는데 지장은 생겼지만 놀라운 광경을 보는 기회가 됐다. 이틀간 캐니언 대장정을 마치니, 왜 이곳이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1위’가 됐는지 분명했다. 광활한 자연 앞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연의 웅장함과 생명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떠나볼 것을 추천한다.
김종선 기자 jongseon05@inh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