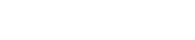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
| 박소은 기자 |
이번 편집국은 독자들에게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사를 향한 관심이 옅어지는 현실에 질이라도 높여 기사의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어쩌다 ‘잠깐’ 읽기만 해도 독자의 구미를 당기는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겉핥기식 행사보도는 가장 먼저 배제됐고, 단순보도는 마감 직전 다른 기사가 펑크나지 않는 한 지양하는 분위기였다. 그 예시가 1306호 ‘교원 충원’ 기사다. 과거에는 전임교원 충원율과 본교 입장만을 담은 ‘단순 보도’가 실렸지만, 이제는 비슷한 주제임에도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고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는 ‘심층 보도’가 돼서야 신문에 실릴 수 있다. 인하대학신문사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변화된 기조다.
심층 취재에 중점을 두는 편집국은 겉으로 보기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듯했다. 그러나 나름의 고충도 있었다. 현상을 분석하거나 직접 기자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의제만이 통과됐다. 보도 주제의 선정 기준과 취재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기자들은 ‘웬만하면 엎어지지 않는 발젯거리’를 들고 왔다. 그런 주제를 찾는 건 쉬웠다. 타 학보사에서 이미 썼던 기사의 의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사의 틀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점점 기자들은 학내 기사 소재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다. 필자가 쓴 1300호 ‘전공책값 부담’ 기사와 1303호 ‘강의평가 실효성’ 기사가 대표적이다.
과거 인하대학신문사가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의제라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충분했지만, 이 기사들엔 함정이 숨어있다. 대학의 소재지, 구성원, 시의성이 고려되지 않는 ‘누구나 언제든 던질 수 있는 의제’라는 점이다. 좋게 말하면 ‘학보사 클리셰 주제’, 나쁘게 말하면 ‘양산형 보도 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대학 학보사도 끊임없이 의제가 흘러나오는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외부에서 참고할 만한 소재가 고갈되자 매주 보도안 회의마다 비상이 걸렸다. 우리 신문사만이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는 필자에게는 상황이 더욱 고되게 느껴졌다. ‘의제를 던지지 못하는 기자’라는 자책감은 덤이었다.
그렇게 발제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중 17년 만에 개정된 ‘학생 회칙’을 전문으로 의제를 던지는 동기 기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주제임과 동시에 학교 내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인하대학신문사만의’ 의제였다. 그리고 잊고 있던 언론계에서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기삿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인하대학신문사가 지금처럼 학내 기사 소재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기엔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다’. 장담하건대 어떤 대학 학보사의 역대 모든 보도면을 훑어봐도 인하대학신문사가 ‘안 쓴’ 보도는 없을 것이다. 1년 가까이 달려 온 방향을 꺾기 힘들지도 모른다. 일종의 관성이다. 그러나 이번 편집국이 신문사의 생존을 위해 ‘심층 취재’에 매달리는 변화를 줬듯이, 앞으로의 편집국에서는 우리 대학만의 의제를 던질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학교 본부나 학생사회 사람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인하대학신문사만의’ 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을 때, 기사는 비로소 그 효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소은 기자 12203234@inh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