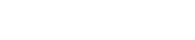하루에도 몇 번씩 에브리타임을 들락날락한다. ‘HOT 게시판’에 들러 기사로 쓸만한 소식이 없는지 기웃거리고, 마땅한 기삿거리를 찾지 못하면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럴듯한 내용을 다듬어 기사를 쓴다. 지난 2년간 인하대학교 방송국(IBS) 기자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를 써왔다. 이 글은 지난 나를 반성하는 일종의 참회록이다.
본교 학생기자로 활동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IBS에서 2년, 임기가 끝나고 인하대학신문사에서 1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 3년의 시간 동안 학내 기자로 활동했지만, ‘박소은 기자’라는 다섯 글자를 들어본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발로 뛰는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BS 보도부 기자 시절 일주일에 두 개, 학내 소식을 담는 ‘낮뉴스’를 작성했다. 활동 당시 내 별명은 ‘한 시간’이었다. 한 페이지 분량의 낮뉴스를 한 시간 안에 작성한다고 해 붙여졌다. 기사를 빨리 쓴다는 건 일종의 ‘짬’이 찼다는 것의 방증이었기에 ‘한 시간’이라는 별명이 뿌듯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게 어영부영 보도부를 총괄하는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다. 부장이 돼서도 여전히 에브리타임이나 남이 취재한 기사를 참고해 낮뉴스를 작성했다. 취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수습국원에게 “낮뉴스 쓸 때 에브리타임이나 인하광장 둘러보고, 기삿거리 없으면 인하뉴스 참고해서 쓰면 돼”라고 교육했다. 부장이 그런 마음가짐이니 보도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다.
이후 IBS를 나가고 인하대학신문에 들어와 수습부터 다시 시작했다. 첫 수습 교육을 받았을 당시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름 학내 기자로서 2년간 활동했지만, 학생 사회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학생 회칙은커녕 자치 기구 이름조차 몰랐으니 교육받는 내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학생 기자가 처음인 동기 수습기자들과 비교해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 취재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시간’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보도안 작성하는 데만 세 시간이 넘게 걸렸다. 애써 작성한 보도안은 반려되거나, 운 좋게 통과되더라도 취재를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수많은 난항에 부딪힌다. 취재원에게 답장 메일이 왔는지 전전긍긍하고, 교직원에게 취재 내용 확인 전화를 했다가 억울하게 쓴소리를 듣는 일도 있었다.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인하대학신문사 기자로서 보낸 반년이 배로 고단하다. 그런데도 내게 다시 전처럼 ‘날로 먹는’ 취재를 할 것이냐 묻는다면 한 치의 고민 없이 ‘아니’라 답할 것이다. 명목상으론 3년 차 학생 기자이지만, 인하대학신문사에선 이제 막 수습 기간에서 벗어난 신입에 불과하다. 과거 안일했던 취재 방식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짐한다. ‘치열한 취재를 통해 학우들의 눈과 귀가 되는 진정한 기자’가 되겠다고.
박소은 기자 12203224@inh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