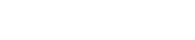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
| 김종선 기자 |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여진 이 말, 이젠 현실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까닭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령인구는 2021년에 47만 6,259명으로 줄어 사상 처음 50만의 장벽이 무너졌다. 대학 입학정원은 49만여 명 정도로, 대학 정원이 입학할 학생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0.84%의 ‘초저출생률’은 20년 뒤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대학도 이에 발맞춰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하니, 따뜻한 남쪽부터 수도권까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스러질 위기다.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면, 학교는 문을 닫게 된다. 재정 악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여러 지방대학이 겪는 고질적 문제다. 학과 통폐합, 정원 축소, 대학 간 통합을 통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들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재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교직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전남의 H대학이 폐교되자, 교직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됐다.
대학의 위기는 인문계열 학과의 존폐와도 맥을 같이 한다. 대학은 생존을 위해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거나, 취업률이 잘 나오지 않는 학과를 고사(枯死)한다.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주요 평가지표다. 그렇기에 인문계열 학과는 정리 대상 1순위가 된다. 기초 인문학 계열 학과를 통폐합한 대학은 수십 곳에 이른다. ‘디지털 대전환’ 속 기업들의 이공계 선호 현상이 심화한 탓도 크다. 기업의 채용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이 어긋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를 정리해야 할까? 대학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학은 학문의 균형 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있으며, 산업체의 수요만 바라보는 취업사관학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중요하다. 무리한 추진은 갈등을 낳는다. 본교의 2016년 ‘프라임 사업’ 추진 과정이 그랬다. 방향성과 무관하게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학령인구 급감이란 명백한 위기 앞에서 인하대 역시 몸집 줄이기와 변화가 불가피하다. 추가선정을 준비하면서 나온 자전학부 추진 계획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지난 ‘교육혁신 공청회’에서 백성현 기획처장은 “교육혁신, 구조적 전환의 개념을 써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추진의 가장 큰 취지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학습선택권 강화’를 이야기했다. 전과 허용률이 30%에 달하고 복수전공이 원활한 본교조차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수요가 높은 학과로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암시한다. 학과 통폐합과 같은 큰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조금씩 구조변화를 해보겠단 의지다. 대학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자전학부 추진을 구성원들이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
김종선 기자 jongseon05@inh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