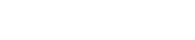|
| 박지혜 기자 |
‘언제적 학생사회 타령이냐’ 얼마 전 에브리타임에서 본 댓글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직면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았나 보다.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가 된 지 오래고, 학생들은 학점과 스펙을 챙기느라 바쁘다. 학생사회에 관심 가져봤자 취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눈앞에 놓인 치열한 취업 시장 때문에, 학생사회는 잊힌다. 그렇게 ‘학생’사회에서 학생이 사라진다.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자치의 위기를 불러왔다. 심지어 이 위기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학교에서 흔하디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생각해보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2년간의 학보사 생활을 돌이켜봐도 가장 많이 듣고, 보고, 썼던 단어는 바로 비대위가 아닐까 싶다. 심지어 수습기자 면접 때, 지원자들에게 “우리 학교 5대 중앙자치기구엔 무엇이 있나”라고 물으니 모두가 비대위를 언급할 정도였다. 우리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했나.
그런데 또, 지난 학기처럼, 이번 학기처럼, 다음 학기도 대부분이 비대위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자치기구 단위에서 입후보가 전무했고, 단과대 및 독립학부 단위에서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번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농담삼아 이런 얘길 했다. “연세대, 고려대 학보에서는 총학생회가 들어서지 않으면 대서특필하는데, 우리는 총학생회가 들어서면 대서특필한다.” 올해 우리 학교 제41대 총학생회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무려 5년 만에 건설됐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내년엔 다시 비대위다. 재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22년도 총학생회는 꼼짝없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어쩐지 기시감이 든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젠 ‘일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생사회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생사회가 무너지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다.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고, 학교 당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 방향을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올 수 있는 대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손해다. 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서 밀리는 각각의 학생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올해 초, 본지 편집국장은 이렇게 논평한 적 있다. “유권자와 출마자 둘 다 관심의 끈을 놓았다. 결국 학생들의 권익은 지난 몇 년간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 자치기구 하나둘씩 사라지다, 그 길의 끝엔 결국 학생사회의 궤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학생에겐 학생사회가 필요하다. 무너져가는 학생사회를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학생사회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치기구가 먼저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이 개혁을 통해 학우들에게 손을 내밀면, 학우들은 자치기구에 쓴소리도 건네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학생사회를 일으켜 세워보자.
박지혜 기자 wisdom99@inha.edu